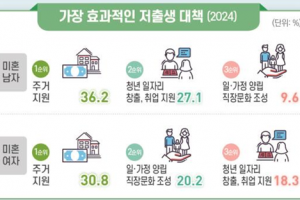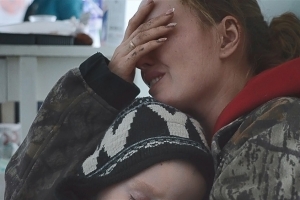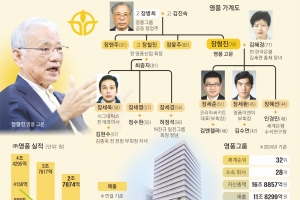[길섶에서] 집으로

황수정 기자
수정 2024-10-28 01:41
입력 2024-10-28 00:22

이즈음 교외로 나가면 버릇처럼 하는 일이 있다. 이름 모르는 마을에 문득 멈춰 골목을 걷는다. 졸다 깬 백구한테 쫓겨나기라도 하면 낭패. 발가락에 힘을 모아 날듯이 걸어야 한다. 대놓고 어슬렁거려서도 안 된다. 내 갈 길 내가 간다는 듯, 그러나 곁눈질을 쉬지 않고.
마당이 넘어다 뵈는 낮은 집들이 이마를 대고 있는 동네, 그 고샅을 느리게 걷기. 안 해 본 사람은 이 맛을 알 수 없다. 인기척은 없어도 사람 온기는 모퉁이마다 스며 있다. 담벼락에 기대 말라 가는 콩대. 얼마나 고요한지, 마르다 말고 콩깍지에서 떨어진 콩알 하나 데굴거리는 소리가 천둥소리!
사람 사는 집보다 빈 집이 많은 동네에 해가 진다. 듬성듬성 불이 켜진다.
누군가 물었지. 집이 사라지면 기억은 어디로 가느냐고.
빈집 앞에 오래 섰다. 한시절 소란했을 대청마루, 신발들 어지럽게 굴렀을 댓돌, 삼시 세 끼 밥 냄새 자욱했을 굴뚝. 누군가의 그리움일 시간들이 환청으로 쏟아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사람의 흔적은 저 혼자 또렷해지는가.
나도 집으로 가야지, 걸음을 재촉하는 만추의 저녁.
황수정 논설실장
2024-10-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