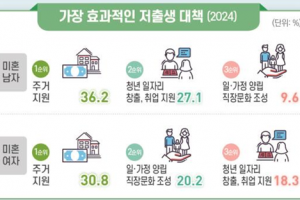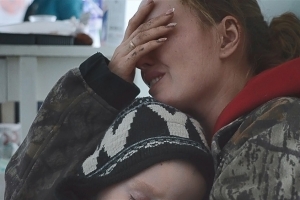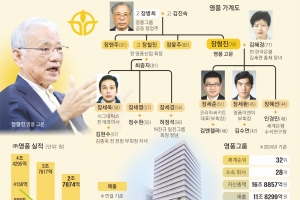[길섶에서] ‘뭐야병’이 준 깨달음

황비웅 기자
수정 2024-10-16 00:33
입력 2024-10-16 00:33

항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드디어 ‘뭐야병’에 걸렸다. 보는 것마다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는 뭐야병은 6세 전후에 특히 심하다고 하는데, 딱 그 나이가 된 거다. 그런데 뭐야병에 걸린 아이에게 제대로 답변해 주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예를 들면 “수도가 뭐야?”라고 물었을 때 “그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야”라고 대답했다고 치자. 그럼 아이는 “도시가 뭔데?”라고 묻는다. 다시 “시골이 아니고 건물도 많고 자동차도 많은 곳”이라는 식으로 대답해 주면, 다시 “시골이 뭔데?”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진다. 어디까지 대답해 줘야 할지 진이 빠지기 일쑤다.
생각해 보니 첫째 딸을 키울 때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 보는 것마다 질문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줬던 것 같다. 첫 질문에 답해 주고 나서는 꼬리를 무는 질문에 시큰둥해하거나 “몰라도 돼”라고 했던 건 아닐까. 둘째를 키워 보니 첫째를 키울 때 소홀했던 것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 둘째에게 치이는 첫째에게 좀더 애정을 쏟아야겠다.
황비웅 논설위원
2024-10-1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